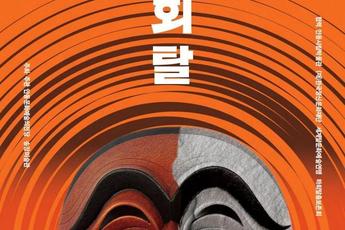상대적 박탈감은 인간의 행복지수를 크게 떨어트린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성상 빈부차가 없을 수 없지만,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면 위화감으로 인해 국민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금·은·동·흙수저의 비율 확대나 고착화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사회의 부(富)의 불평등 구조를 대하면 우울함이 해일처럼 밀려온다. 국세청 ‘통합소득 1천 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소득은 평균 18억 원이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것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상위 0.1% 기준선은 7억4200만 원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4억7930만 원이다.
심해지는 소득 격차…상하 900배
상위 10%는 평균 1억 5200만 원이고, 하위 10%의 1인당 연간 근로소득 200만 원이다. 상위 0.1%가 하위 10%보다 900배 많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만 해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29.2%로 미국(40.5%)은 물론 싱가포르(30.2%), 일본(34%), 영국(38.5%), 프랑스(32.4%), 뉴질랜드(32.6%) 등 비교 대상 대부분 국가보다 낮았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성과가 대부분 상위 10% 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배분됐음을 의미한다. 소득 불평등은 학력과 직업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동을 어렵게 한다.
사실 부의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발표한 보고서 '99%를 위한 경제'에 따르면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제프 베저스 아마존 창업자 등 세계 최고의 갑부 8명의 재산이 세계 소득 하위 50% 인구의 재산과 맞먹는다.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는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점이다.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는 이미 우리 사회의 고질이 된 지 오래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악화되며 ‘K자형’ 소득 양극화가 심화할 조짐이다. 소득 불평등은 학력과 직업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동을 어렵게 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소득 불평등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나 올곧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꿈‘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사회 구현이 절실하다. 사실 서민의 꿈은 소박하다. 소찬(素饌)이지만 먹고사는 데 걱정 없고, 누추해도 거처할 작은 집 한 칸 장만하길 꿈꾼다. 힘 있고 가진 자들은 권세와 명예, 더 많은 재물 등을 바라지만 소시민은 당장 오늘의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다.
그럼 정치, 정부란 무엇인가. 유가(儒家) 최고 경전의 하나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상서(尙書)‘ 에는 “정치란 백성을 잘 돌보는 데 있다.(政在養民)”고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다. 백성이 ‘마음 편하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함’을 뜻한다.
‘계층 간 이동 사다리’ 복원 시급
중국 역사에서 대표적 태평성대인 '3대 성세(盛世)'가 있다. 한나라 문제와 경제의 치세인 ‘문경(文景)의 치(治)’, 당나라 태종의 치세 시기인 ‘정관(貞觀)의 치’, 청나라 강희제·옹정제·건륭제 130여 년의 통치로 이어진 ‘강옹건(康雍乾) 성세’이다. 공통점은 권력층이 천하에 해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백성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었다는 사실이다. 소득 불평등은 대물림 현상을 낳아 사회적 이동을 어렵게 한다. 누구나 올곧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꿈'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사회 구현이 절실하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지수를 개선, 계층 간 이동을 원활케 하는 해결 과제가 적잖다. 미래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을 추구하되 불평등 완화에도 노력하길 당부한다. 우리 사회의 실종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때다.